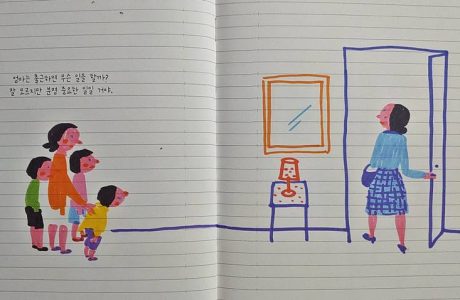‘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열 명의 자식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열 명의 자식들 집을 여행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는 묘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밤의 숲에서』.
‘열 명의 자식을 키우느라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열 명의 자식을 가진’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같아 먹먹하기만 합니다. 열 명의 자식들 집을 돌며 여생을 보내는 할머니. 다들 제 삶 살아내기 바빠서 어머니에게는 살뜰한 신경 써주지 못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서운해 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자식들 키우느라 그렇게 정신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그런 할머니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고단한 인생 살아오며 굳게 지켰던 마음마저 잃어버린 채 다다른 곳은 밤의 숲. 할머니는 그곳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 돌아가려고 애쓰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버린 길을 다시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할머니 앞에 펼쳐진 길은 오로지 밤의 숲으로 더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뿐입니다.
할머니는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험한 길에서 이제껏 지켰던 마음마저 잃었습니다.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야.
넌 이제 이곳으로 왔으니까.
마침내 할머니는 밤의 숲을 받아 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묻는 고양이에게 오래도록 잊고 살아온 자신의 이름은 ‘피비’라고 말하는 대신 “이제 새 이름이 필요하겠네.”라고 대답합니다. “너는 한때 딸이었어? 엄마였어?”라고 묻는 동박나무에게 할머니는…
나는 나였어.
나는 그냥 나였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가볍게 날아오른 할머니는 새가 되어 그리운 가족에게로 날아갑니다.
밤의 숲은 치매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마음까지 모두 잃어버린 할머니가 밤의 숲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고 온전히 ‘나’라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자면 온갖 감정들이 마음 속에서 뒤엉킵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던 ‘나 다운 나’가 아니라 태초의 것처럼 순수한 본연의 ‘나’일 겁니다.

밤의 숲에서
글/그림 임효영 | 노란상상
(발행 : 2019/04/29)
『밤의 숲에서』는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궁금증과 상상, 그리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남겨진 이에게나 떠나간 이에게나 이별이란 참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소중한 이에 대한 마음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내려 놓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로합니다.